BioINpro
(BioIN + Professional) : 전문가의 시각에서 집필한 보고서 제공규제과학 개념과 정책 동향
- 등록일2016-10-13
- 조회수15964
- 분류기타 > 기타
-
저자/소속
현재환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
발간일
2016-08-30
-
키워드
#규제과학
- 첨부파일
-
차트+
?
차트+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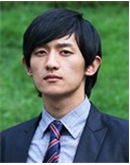
서론
최근 바이오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에게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란 용어가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이 분야가 한국의 바이오제약시장 육성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기관부터 제약기업, 각종 CRO(Cont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전문기관)에 이르기까지 신약 개발과 연관된 모든 행위자들 사이에서 규제과학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이해가 일반화된 듯하다(퍼시피시 2015).
그러나 규제과학 인력 양성 열풍에도 불구하고, 막상 규제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는 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에 대한 정의 등이 가끔씩 언급되지만, “FDA가 규제하는 제품들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들을 개발하는 과학”(the science of developing new tools, standards and approaches to assess the safety, efficacy, quality and performance of FDA-regulated products)이라며 “FDA 규제 제품”으로 연구 대상을 명시하는 미 FDA의 정의는 한국적 맥락에서 수행될 규제과학이 무엇인지 답해주지 못한다(FDA 2010). 한국에서는 규제과학이 새로운 학문 분야인지, 아니면 20세기 중후반부터 이미 존재하던 의료기기 및 의약품과 관련된 규제업무(regulatory affairs)를 담당하는 규제인력을 양성하는 전통적인 분야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의 등장 배경과 그에 따른 다양한 용례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을 사례로 삼은 규제과학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 및 각국의 규제과학 정책들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 글은 규제과학에 대한 국외 동향 분석이 한국의 규제과학 육성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이런 규제과학에 대한 개념적, 정책적 분석은 한국의 규제자들과 규제 관련 과학자들이 어떤 규제과학을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2. 규제과학 개념의 등장 배경과 국가별 발전
가. 규제과학 개념의 등장 배경과 두 가지 용례의 구별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을 누가 처음 고안했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지도 않다.1) 다만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규제과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학자들은 의약품, 식품,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를 입안하거나 규제에 관한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규제 기관 및 관련 과학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연구자들이었다는 점이다.2) 북미의 STS 연구자들은 일찍부터 과학과 사회,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사회학적, 역사적 경험 연구들을 수행해왔다. 1969년 미국에서 환경정책기본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발효되면서 모든 연방기관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설립되어 화학물질의 안전성이나 위험성들을 평가하는 과학 연구들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탁하여 도출된 과학적 결론들에 기초해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논쟁들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그때 STS 연구자들은 이런 ‘규제와 관련된 과학 활동’이 과학과 정치의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연구주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들을 발전시켰으며, 그 가운데 등장한 산물이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
1) Moghissi et al. (2014)은 1985년에 Moghissi가 규제과학연구소(Institute for Regulatory Science)를 설립하면서 규제과학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본의 임상약리학자들은 1987년에 우치야마 미츠루(内山充)가 최초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쉴라 자사노프(Sheila Jasanoff)가 그녀의 1987년 논문에서 이미 규제과학이란 용어가 사용했기에 구미에서는 자사노프가 이 개념의 최초 고안자라고 결론지었다(Jasanoff, Kurihara, and Saio 2011).
2) STS는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가치들이 과학 연구와 기술 혁신에 영향을 끼치며 이 같은 과학기술의 변화에 의해 다시금 사회, 정치,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꾀하는 간학제적 학문 분야이다(한국과학기술학회 2014).
쉴라 자사노프(Sheila Jasanoff)는 이런 사회학적 분석 개념으로 규제과학이란 용어를 고안한 STS 학자이다. 그녀는 미국에서 EPA의 등장과 과학적 평가에 따른 규제 입안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절차로 인해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이라는 영역과 산업이나 정부를 위해 규제를 입안하는 공공 정책이라는 영역이 구별된다는 전통적인 과학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화학물질의 독성평가와 같이 규제 입안과 관련된 정책 유관 과학(policy-relevant science)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학술과학(academic science)과 연구목적, 제도, 절차, 기준, 정치와의 관계 등과 같은 사항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런 학술과학과의 대비를 바탕으로 규제 입안과 관련된 정책 유관 과학의 활동을 이해할 도구로 ‘규제과학’이란 사회학적 분석 개념을 발전시켰다(Jasanoff 1987; 1990). 자사노프 이후의 STS 연구자들은 산학연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과학적 연구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학적 실천의 변화하는 조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규제과학’ 개념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어윈(Alan Irwin)과 동료들은 유럽연합의 농약과 관련한 독성 화학물질 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과학적-사회적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과학’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정련했다(Irwin et al. 1997).3)
------------------------------------------------------------------------------------------
3) 자사노프가 규제과학이란 분석적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미국의 전통적인 위험 관리 거버넌스를 비판한 경우에 대한 국문 소개로는 현재환, 홍성욱 (2015)을 참고. 이런 규제과학 개념을 활용해 전개된 STS의 사회학적 분석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현재환 (2015)을 참고.
이렇게 STS 학자들이 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 규제과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한 사례 연구들을 발굴해내는 시기 즈음부터, 의약품 규제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과 규제자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규제 관련 과학 활동이 전통적인 학문 분야 내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라는 것을 점차 인지하면서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는 용어를 매우 간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1년 미국임상약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FDA의 약물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소속의 넬슨(Robert Nelson)과 펙(Carl Peck)은 신약승인을 검토하는 약물평가연구센터의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임상약학과 규제과학(clinical pharmacology and regulatory science)을 임상의들에게 가르치는 내부 직원 대학(internal Staff College)을 창설하고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했다(Nelson and Peck 1991).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의약품, 식품, 독극물의 시험 및 검사를 담당하던 국립위생시험소의 부소장 우치야마 미츠루(内山充)가 흔히 위생화학(衛生化学)으로 불리던 국립위생시험소의 과학 활동을 정의하기 위해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レギュラトリーサイエンス)이란 용어를 사용했다(内山充 1987a; 1987b). 그러나 미일의 규제자들과 의약품 규제 관련 연구자들이 규제과학이란 용어를 통해 FDA와 같은 규제기관의 과학 활동을 규제과학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후반 이후이다. 다음 절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미국에서 규제기관의 과학적 역량의 부족과 규제개선을 통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노력들이 결합되면서 규제 담당자 및 유관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규제과학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출현했다.
요약하자면, 지난 세기 동안 STS의 사회학적 분석 개념으로서의 ‘규제과학’과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 담당자 및 관련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및 규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제과학이라는 두 가지 용례가 다소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 이 두 가지 용례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규제과학에 대한 정보의 홍수 가운데 길을 잃기 쉽다. 실제로 일본에서 규제과학학회를 개설 준비 중이던 임상약리학자들은 STS 학자 자사노프를 대상으로 미국에서의 규제과학 개념의 소개를 부탁했는데, 이들 인터뷰에서는 양쪽이 서로가 다른 의미의 규제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지 못한 채 서로의 개념적 차이를 일본과 미국의 규제과학의 차이로 오해하는 모습을 보였다(Jasanoff, Kurihara, and Saio 2011). 한국에서도 ‘규제과학’에 관한 STS 연구들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STS 학자들이 과학기술정책의 분석도구로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기에 오해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이 두 가지 용례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다.
나. 의약품 개발을 위한 규제과학 개념의 국가별 발전
규제과학의 두 가지 용례에 대한 혼동과 함께 한국에서 규제과학의 정의와 관련해 일어나는 또 다른 오해는 규제과학이라는 분야가 명확히 정의되고 확립된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육성 대상으로 부상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경우, 현재 FDA 등이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규제과학이라는 분야(discipline)와 규제과학자라는 전문가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은 201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규제과학으로 묶일 수 있는 규제기관의 규제 관련 연구 활동은 그 정의에 따라 19세기 말부터 존재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말이다.
[표 1. FDA, EMA, PMDA의 규제과학에 대한 정의]
규제기관 | 정의 |
FDA | -The science of developing new tools, standards, and approaches to assess the safety, efficacy, quality, and performance of all FDA-regulated products. |
PMDA | -The science that provides appropriate predictions, evaluations, and judgments to incorporate the outcomes of technology into the most desirable form for people and society. -The science of predicting, evaluating, and determining, fairly and promptly, the quality, efficacy, and safety of pharmaceuticals, medical devices, and regenerative medicine products,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
EMA | -A range of scientific disciplines that are applied to the quality, safety and efficacy assessment of medicinal products and that inform regulatory decision-making throughout the lifecycle of a medicine. It encompasses basic and applied medicinal science and social sciences,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standards and tools. |
출처 : FDA (2010); 厚生労働省 (2014; 2015); EMA (2013)
현재 규제과학을 정확히 명시하고 육성하는 대표적인 규제기관으로는 미국의 FDA, 일본의 PMDA(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유럽의 EMA(European Medicines Agency)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정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들이 모두 ICH(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주요 기관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록 일본에서는 규제 입안자들 및 관련 과학자들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과학(レギュラトリーサイエンス)이라는 용어가 제안되고 사용되어 왔지만, 의약품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구가 이를 실제로 채용하여 추진한 것은 PMDA가 설립되고 이에 규제과학 연구 기능을 부여한 2010년 이후이며, 유럽에서도 2010년에 출간된 “EMA 2015 로드맵”(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Road Map to 2015)에서야 규제과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FDA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FDA가 규제과학 분야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이런 FDA의 영향 가운데 PMDA 및 EMA가 규제과학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 규제과학에 대한 관련 연구 지원 제도 및 교육 기관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규제과학의 국가별 ‘제도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경험부터 살펴보아야 한다.4
------------------------------------------------------------------------------------------
4) 이하의 절에서 소개되는 FDA의 규제과학 이니셔티브 추진 경과의 전반적인 개요는 Jakimo(2013)를 주로 참고하되 이를 보완하여 서술했음을 밝혀둔다.
...................(계속)
* 로그인 하셔야 자세한 정보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
- BioINregulation 바이오 분야 비용편익분석: '합성생물학 개발·실험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2024-10-07
- BioINregulation 생명(바이오)분야 규제과학적 연구분석의 현황과 과제 2024-04-26
- BioINregulation 생명의학 윤리 규제에서 연구와 비연구 구분기준의 과학화 : 미국 CDC의 공중보건 프로그램 평가 연구윤리 규제 사례 분석 2022-08-29
- BioINregulation 생명공학 규제과학 리더십 역량 제고방안 2022-02-16
- BioINregulation 유전자가위 기술로 바라본 규제과학 2021-06-09


 규제과학 개념과 정책 동향.pdf
규제과학 개념과 정책 동향.pdf
 FDA, EMA, PMDA의 규제과학에 대한 정의
FDA, EMA, PMDA의 규제과학에 대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