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연구성과
뇌 속 공간학습의 비밀을 밝히다
- 등록일2012-03-30
- 조회수8110
-
성과명
뇌 속 공간학습의 비밀을 밝히다
-
연구자명
김진현 박사, 세바스쳔로열 박사
-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능커넥토믹스연구단
-
사업명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사업
-
지원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보도자료발간일
2012-03-30
- 원문링크
-
키워드
#뇌 #공간학습
- 첨부파일
핵심내용
-네이쳐 뉴로사이언스誌 발표/ 뇌가 공간 정보를 습득하는 새로운 원리 규명 -
□ 그동안 공간학습에 관련된다고 이론으로만 알려진 뇌의 해마 속 ‘장소세포(Place Cell)’의 정보습득 원리를 해외과학자와 국내연구진이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사업을 통해 수행된 이번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문길주) Sebastien Royer박사(제1저자)와 김진현 박사가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 산하 Janelia Farm Research Campus와 공동으로 ‘1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이번에 그 결과가 네이처(Nature)에서 발간하는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 ‘네이쳐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誌 온라인판에 3월 25일자로 게재되었다.
(논문명 : Control of timing, rate and bursts of hippocampal place cells by dendritic and somatic inhibition)
□ 해마는 뇌에서 공간탐색,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 속에는 장소세포(Place cell)라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 이 세포는 실험생쥐가 특정장소에 있을 때 강하게 활성화(발화 : 發化)하며 생쥐가 이동하면 다른 장소세포가 다시 활성화된다. 즉 이 세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다.
○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활성화패턴을 억제성 신경세포들이 조절한다고만 알려져 왔고, 아직까지 억제성 신경세포의 구체적 역할과 조절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 Royer박사 연구팀은 획기적인 실험동물 훈련장치인 ‘트레드밀’과 최신 뇌 회로 분석기술인 광유전학 기법을 이용하여 뇌가 공간정보를 습득하는 원리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억제성 신경세포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성공하였다.
○ 이번 실험은 실험생쥐 뇌 속 해마의 특정지역에 광학탐침을 장착한 후, 그 지역 세포체주위와 수상돌기에 영향을 주는 고유의 억제성 신경세포(소마토스테틴형·파브알브민형)들의 작용을 빛으로 억제하면서 학습기억과 관련된 뇌파인 쎄타파의 변화를 전기생리학적으로 기록하였다. 실험 결과, 소마토스테틴형 신경세포의 작용을 억제한 경우, 쎄타파 진행중 다발적 활성화 현상이 증가했고, 파브알브민형 신경세포의 작용을 억제한 경우, 쎄타파의 위상변이가 발생했다.
□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해마의 공간학습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기억습득의 원리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간질과 알츠하이머 등 해마 손상으로부터 오는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09년 12월부터 KIST 기능커넥토믹스 WCI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광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지 어거스틴(George Augustine) 듀크대 교수를 센터장으로 초빙하고, 해외연구자 20명을 포함한 46명의 국·내외 우수 연구자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KIST WCI센터는 광유전적 생쥐 57종 확보, 하이브리드 생쥐 2종 개발, SCI 논문 21편 발표, 특허 6건 출원 등 세계적 연구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상세내용
연 구 결 과 개 요
해마는 인간의 뇌에서 공감탐색,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대뇌의 좌·우 측두엽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기관이 사라지면 새로운 기억이 생겨나지 않아 기억의 제조공장이라고도 불린다.
해마 내에는 장소세포(Place cell)라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 이 세포는 실험생쥐가 특정장소에 위치할 때 각각의 세포가 강하게 활성화하며 실험생쥐가 이동하면 또 다른 장소세포가 활성화한다. 즉 이 세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활성화패턴이 억제성 신경세포들로 인해 조절된다고만 알려져 있지 이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특정세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광(光)자극을 이용하여 특정 뇌기능과 관련된 특정 신경세포의 활동을 선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 기법인 광유전학(Optogenetics)기법을 기반으로 특정행동실험이 가능한 실험생쥐 공간학습장치(트레드밀)을 개발하여 억제신경세포들의 활성화를 기록·관찰하였다.
트레드밀은 트랙의 길이가 1.8미터인 러닝머신으로서 이 위에서 생쥐는 뇌가 고정된 상태로 설탕물이라는 보상요소를 주입함에 따라 트랙을 움직이며 운동하게 된다. 생쥐의 뇌에는 뇌의 작용을 전기생리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뇌파검사(EEG)촬영장치와 광섬유 전기탐침이 장착되어 있다. 공간학습이 이루어질 발판 위에는 실리콘 돌출물을 설치하여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발판을 걸을 때 느끼는 촉각적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 턱(spots)이 설치되어 있다. 운동 중인 생쥐는 각각의 자극의 위치를 감지하며 공간감각을 학습해 간다. 본 연구팀은 한 트랙의 운동이 끝나서 보상요소인 설탕물이 주입되기까지 한 주기의 뇌파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결과 억제성 신경세포들로 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은 해마고유 영역 중 CA1지역 세포체주위에 영향을 주는 파브알브민형 신경세포와 수상돌기에 영향을 주는 소마토스테틴 신경세포의 작용을 광유전학 침묵기법을 사용하여 억제하고 이 때 뇌파 중 학습기억에 필수적인 쎄타(θ)파의 변화를 전기생리학적으로 기록하였다. 그 결과 쎄타파 진행 중 소마토스테틴 신경세포 억제시 다발적 활성화(burst firing)현상이 증가되었고, 파브알브민형 신경세포 억제시 쎄타파의 위상변이(phase shift)를 일으켰다.
이번 연구는 행동하는 동물의 뇌에서 직접 억제성 신경세포의 역할을 규명하였고, 이는 향후 해마 전체 연구에 확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주고 있다.
용 어 설 명
1. 네이쳐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誌
세계적인 학술저널 Nature 출판그룹에서 발간하는 신경과학계의 권위 있는 학술지이다. 다른 전문 학술지에서 호평을 받거나, 저명 과학자의 검증을 거친 뒤에야 게재될 정도로 논문의 심의과정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인용지수(Impact Factor)가 2010년 기준 14.191이다. 이는 신경과학(Neuroscience) 분야 총 학술지(239개)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 광유전학(Optogenetics)
특정 파장의 광(光)자극을 이용하여 특정 뇌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의 활동을 선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 기법으로 이 광자극에 반응하는 분자 및 신경세포들의 분석하여 정확한 뇌회로를 파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파장의 빛 자극에 의해 신경세포의 활성 및 생쥐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획기적 실험기법인 광유전적 탐침 (Optogenetic probe)기법은 스탠포드 대학의 Karl Deisseroth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Boyden, et al. 2005), 광유전적 탐침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생쥐 (Optogenetic mouse)는 듀크대학의 George Augustine 교수에 의해 제작되었다 (Arenkiel, et al., 2007). 광유전생쥐를 뇌질환모델생쥐와 교배할 경우 특정 질환과 관련된 뇌회로를 정상 뇌회로와 비교 분석하여 특정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 근본적인 병인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뇌파검사(EEG)
뇌의 전기적 활동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분석하는 것으로 CT, MRI 와는 달리 뇌의 기능을 알 수 있어 간질이나 뇌사 종양, 뇌종양, 두부외상, 정신장애 등을 판별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4. 세타파(theta wave, θ)
4~8Hz의 진동수를 가지는 뇌파의 일종이다. 각성과 수면 사이를 반영한다. 세타파가 우세할 때 사람들은 깊은 통찰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이나 문제해결력이 솟아나기도 한다. 세타파는 유쾌하고 이완된 기분과 극단적인 각성과도 관련이 있고 동시에 어떤 일을 수행하겠다는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
5. 소마토스타틴 (Somatostatin)
뇌하수체의 성장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 시상하부에서 추출하고 정제되었으며, 혈중에서는 빠르게 파괴된다. 성장호르몬의 기초분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수면, 운동, 스트레스를 비롯한 각종 자극이나 약제에 의한 성장호르몬 분비증가를 억제하여 첨단거대증이나 거인증의 혈중성장호르몬농도도 저하시킨다. 뇌에서는 특정 억제성 신경세포에서 생성되고 분비된다.
6. 파브알부민 (Parvalbumin)
칼슘결합단백질 중 하나로 세포내 칼슘농도를 조절하는 알부민 계열의 단백질이며, 분자량은 약 12,000으로 1분자당 2개의 Ca2+과 결합하고 있다. 자체의 생리적 의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뇌에서는 특정 억제성 신경세포에서 발현된다.
7. 트레드밀(Treadmill)
생쥐 뇌의 공간학습을 기록하기 위해 설계한 특수한 러닝머신이다. 발판의 넓이가 1.8미터이며, 전기생리학적 관찰을 위해 생쥐의 뇌에 광학탐침과 뇌파검사(EEG)가 가능한 실리콘이 장착된다. 생쥐는 뇌가 고정이 된 채, 설탕물이라는 보상요소 주입에 따라 발판을 움직이며 반복적 운동을 하게 된다.
사 진 설 명
<그림 1. 트레드밀 개념도>
○ 빛 조절이 가능한 광섬유 전기탐침이 내재된 녹색 실리콘탐침이 실험생쥐의 해마 중 CA1 지역에 장착
○ 길이 1.8m의 발판을 가진 트레드밀에는 시각적 자극을 부여하는 가시 모양의 돌출물(spines)과 촉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턱(spot)을 설치
<그림 2. 주요 실험결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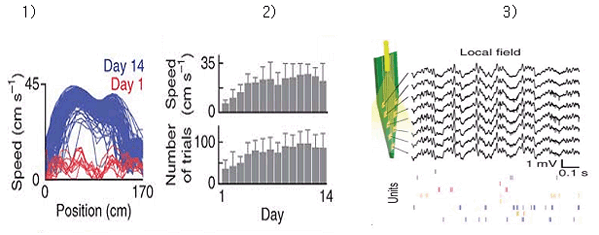
○ (1번 그래프) 한 트랙당 위치에 변화에 따른 생쥐 운동 속도변화
※ 한 트랙의 운동을 마친 후, 설탕물이 재 주입되는 170 지점에 다다를 때 보상주입 지점을 인지한 생쥐는 속도를 서서히 줄이게 됨
○ (2번 그래프) 1일부터 14일까지의 생쥐의 운동속도변화(완만히 증가)
○ (3번 그래프) 녹색 실리콘 탐침장치를 통해 뇌파(EEG) 변화 측정가능
지식
동향


 뇌속_공간학습의_비밀을_밝히다.hwp
뇌속_공간학습의_비밀을_밝히다.hwp